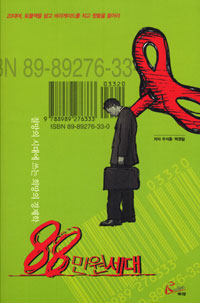우리 아이들이 날카로운 도구로 자기 손목을 긋는다. 허벅지와 팔뚝도 긋는다. 때론 사혈(피를 몸 밖으로 빼는 것)을 하고 위험할 정도로 많은 진통제류 약물을 입에 털어넣기도 한다. 전문가들이 ‘자해’의 범주에 넣는 행동들이다. 아직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으나, 아이들은 이구동성 말한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원인은 아이들마다 다르다. 각양각색 이유를 천편일률로 좁혀 설명하려 드는 것은 아이들을 더욱 낭떠러지로 모는 또 다른 폭력이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성장학교 별 교장)는 10월4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이들이 부모 또는 중요한 어른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무언가’ 심리적 고통을 처리한다. 그건 말로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말로 하기가 어렵거나 소용없다고 느낀다는 얘기다. 여러 가지 복잡한 신호이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말로 하기 어려운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해의 원인은 개별적이지만, 김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 자해와 관련해 주목하는 ‘요즘 아이들의 두드러진 정서’가 있다. 첫째, 멸망 정서(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둘째, 고생 정서(사는 게 너무 힘들다-태어나면서부터 고생했다). 셋째, 왕부담 정서(부모가 나 때문에 산단다-재롱만 10년째 떨고 있다). 넷째, 섭섭 정서(민모션-울고 싶은데 소리 내어 울지 못하고 감정을 숨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다섯째, 복잡한 등교 정서(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않는다-밥 먹으러, 친구 만나러 혹은 삥뜯고 ‘작업’하러 간다).
그중에서도 어른들의 불안한 정서가 투영된 ‘이생망’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철벽 같은 현실이 됐다. 이번 생은 망했고, 환멸을 느끼게 하며, 심지어 ‘리셋’도 싫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감정적 고통을 느끼지 않는 무생물로 태어나고 싶다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한겨레21>이 인터뷰한 자해 여고생은 이렇게 되물었다. “이생망, 민모션 때문에 저도 한번 제대로 깨졌고 회복한 지 얼마 안 돼요. 제 안에 항상 이생망이 내재돼 있는데 주변에 있는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고 싶으니 민모션이 돼죠. 우리나라 학교에 다니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미래에 대한 비관과 절망이 최근 들어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정서는 아니다. 신해나 위클래스(학교 상담실) 교사는 “아이들은 ‘다 망쳤어,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같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요즘 한국 아이들의 이생망 정서에는 어른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 김 교수는 “한국 청소년들은 그 시기 성적이나 경쟁의 결과가 자기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고 여기고, 이를 자기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받아들인다. 옛날에는 공부가 싫으면 장사라도 하고 오히려 더 다양한 사회 진출 방안이 있었으나, 지금은 미래를 더욱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88만원 세대’ 뒤 11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저성장 사회의 자아와 고성장 사회의 자아는 다르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을 표현한 <88만원 세대>(2007)가 출간된 지도 어느덧 11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최소 10여 년간 “젊은이들이 살기 어려운” 문화 속에 살았다. 그 기간 기성세대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상황을 악화하는 과정을 목도하고 체득하며 성장하고 있다.
먹고살기 힘들고, 자식 고생시키는 건 더 힘든 한국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거나 하나만 낳기 시작한 것도 벌써 20여 년째다. 날 때부터 부모, 양가 조부모, 심지어 이모·고모·삼촌 기대까지 한 몸에 짊어진 아이들은 기저귀를 떼기가 무섭게 살얼음판 같은 경쟁 체제로 등 떠밀린다. 초등학교 6학년생 중에 “벌써 10년째 공부 중”이라는 아이가 수두룩하다. 남들과 비교당하면서 버텨내려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한다. 스무 살이 ‘다른 스무 살보다 내가 못해’ 비교당하는 것과 열세 살이 ‘다른 열세 살보다 내가 못해’ 비교당하는 것, 버티는 힘이 다르다. 버텨낼 힘이 없는데 어려서부터 비교 경쟁에 노출되니 살고 싶지가 않은 거다.
아이들도 뉴스를 본다. 스마트폰으로 포털에 접속하면 첫 화면이 뉴스다. 날 때부터 고생해봐야 소수를 제외하곤 ‘정규직’도 실현 불투명한 꿈이라는 걸 안다. 경쟁의 결과는 일찍 판가름 나고,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일은 없으며,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이들도 안다. 나 아니면 부모의 소망을 이뤄줄 사람이 없는데, 나는 부모의 기대를 결코 충족해줄 수 없다. 숨조차 쉴 수 없는 답답함이 아이들 가슴을 조인다.
자해하는 아이들 중에 ‘민모션’, ‘스마일마스크증후군’(얼굴은 늘 웃고 있는데 마음은 우울·무기력·불안한 상태)을 말하는 아이도 많다.
아이들의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기제는, 알고 나면 사실 좀 웃프다. 김 교수는 “웃기는 얘긴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나약하다’고 하지만, 아이들도 80년대 후반과 90년대 학번 부모들을 향해 ‘부모들이 너무 마음이 약해졌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아이가 ‘엄마 아빠, 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부모가 ‘내가 더 고통스럽다’고 반응한다는 얘기다. 아이가 힘든 걸 말했을 때, 부모가 오히려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은데도 꾹 참고 다니는 건 ‘학교 안 다니면 엄마가 죽을 것 같아서’다. 여학생 중에 특히 이런 아이가 많다.
‘엄마 아빠 힘들까봐’ 울 수도 없다
김 교수는 부모와 자녀가 ‘채권-채무자’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녀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자녀를 소유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은 물론 함부로 남과의 비교 경쟁을 명령·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부모가 아이에게 ‘내가 너를 낳고 길렀으니 무언가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식으로 구는 건 전형적인 채권자 태도이다. 부모가 채권자 위치에 있으면 아이는 부모에게 힘들다고 말할 수 없다. 못 갚는 게 괴로워서, 그런 자신이 혐오스러워서, 아이는 자해로 나아갈 수 있다.
글·사진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